728x90
반응형
코로나가 그토록 온 세상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감기며 독감까지 함께 설쳤다.
한 반의 과반수가 감기 환자일 정도였다. 온통 감기였다.
나는 유독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왜냐하면 아들이 병상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들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시국, 4년 여 동안에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벗고 수업한 적이 없다. 나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을 때부터 마스크를 벗고 수업했다. 당연하다. 마스크를 낀 채로 수업하는 것은 상상 그 이상으로 힘들다. 나도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싶은 맘이 굴뚝같았다.
어느 날 수업하러 갔더니 교탁 옆에 허접한 그림 한 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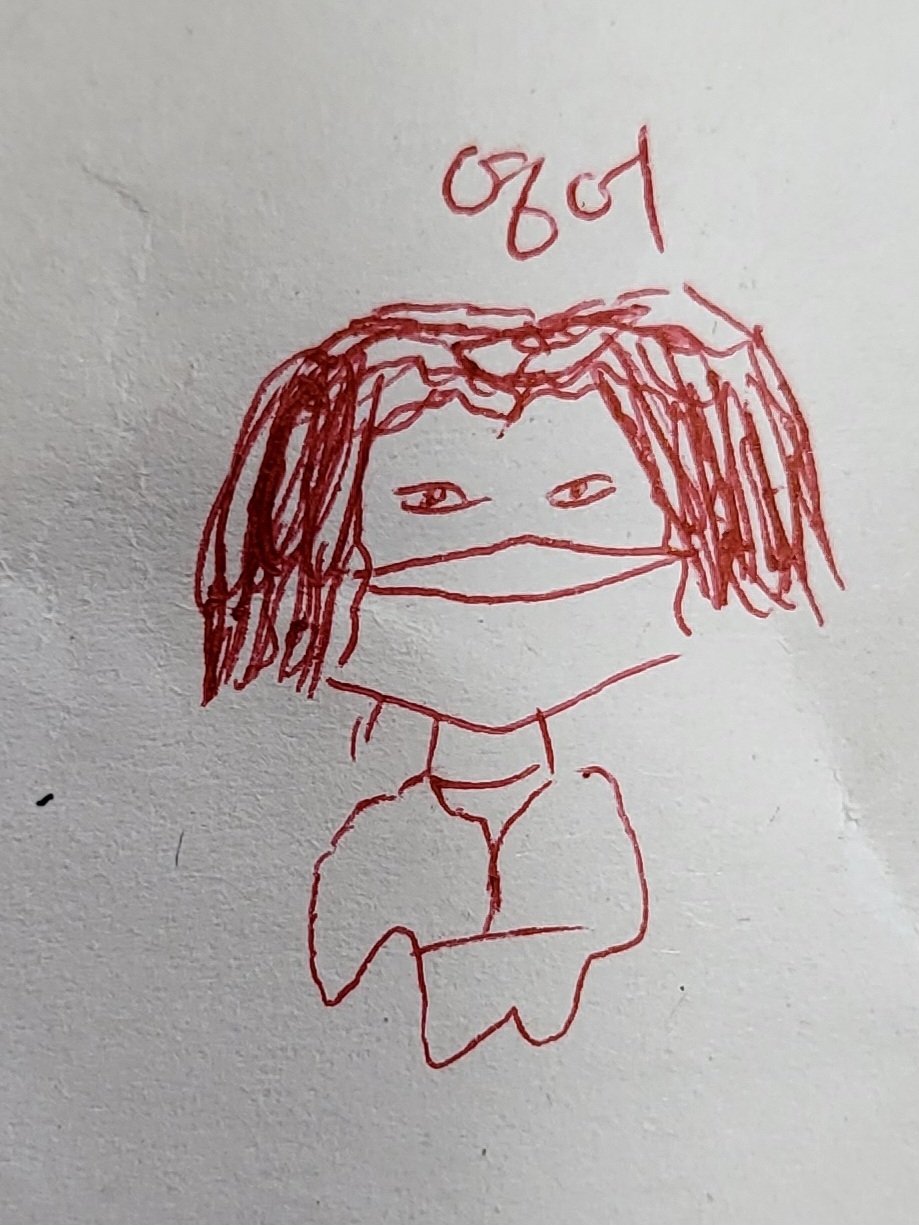
"이게 뭐냐?"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 어, 나도 있네."
한 학생이 모든 과목 교사들의 캐리커처를 한 장의 종이에 그렸단다. 학년말이라 긴장은 풀려 뭐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새다. 그 그림 속에, 오직 나만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학생들은 내가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본 적 없다.
-> -> ->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토요일 담당 활보샘이 감기에 걸렸다. 그럴 때는 내가 땜빵 간병을 해야 한다. 밤 10시에 간병 임무를 교대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몹시 추웠다. 기습적인 한파로 영하 14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체감 온도는 -21도였다. 집에 도착하니 몸이 으슬으슬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그다음 날, 일요일 예배 도중에 난방기가 작동을 멈췄다. 강추위 때문에 실외기가 제상 운전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온도계의 숫자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다. 처음에 18도였던 실내 온도가 5도까지 내려갔다. 예배 시간 내내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릎과 발이 시렸다. 교회 안에 핫팩도 있었으나 갑자기 닥친 추위라 그걸 챙길 생각을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재채기가 쉼 없이 뿜어져 나왔다. 엄청 센 바이러스가 침입한 듯했다. 감기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몇 년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 마스크를 잘 챙겨 끼고 지냈을 뿐 아니라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도 코로나를 피해 갈 수 없었다. 남편이 확진되어 동거인은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었다. 설마 했는데 결과는 양성이었다. 그러나 증상은 없었다. 남편은 목안을 면도칼로 회를 치는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는데 말이다.
평소에 나는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액상 애드ㅇ'이라는 상비약 한 알만 먹으면 거뜬해지곤 했다.
이번 감기도 역시 그랬다. 열이 없고 기침도 하지 않았다. 콧물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아프지도 않았고 몸살 기운도 없었다. 그래서 코로나나 독감이 아닌 게 분명했다. 그래도 키트로 검사를 해봤다. '음성'이었다. 입맛도 좋고 커피도 향긋했다.
대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나는 입맛부터 떨어진다. 그리고 커피가 당기지 않는 편이다.
아무튼 나는 감기에 걸린 건 확실했다. 약간만 찬 공기를 쐬더라도 심하게 재채기가 나왔다. 그리고 문 손잡이나 쇠붙이에 닿으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나의 감기 증세는 그 정도지만 내게 들어온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면 된통 앓을 것 같았다.
그래서 중증환자인 아들에게 이틀간 가지 않았다. 남편과는 식사를 따로 했다.
리모컨은 위생장갑을 끼고 만지고 화장실도 공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끼 식사 후에 상비 감기약을 먹었다. 그랬더니 일상 생활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었다.
이틀 정도 그렇게 보냈더니 재채기하던 증상도 사라졌다.
"아무래도 심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거 같아요. 바이러스 부대가 여긴 아닌가 보다, 라며 철수해 버린 것 같아."
라고 남편에게 우스갯소리를 했다.
수요일 2교시에 수업이 있었다. 수업하러 가기 전에 습관처럼 거울을 봤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탄 후에도 반드시 거울을 본다. 아무 이상 없었다.
'됐어.'
라고 속으로 말했다. 구름다리를 건너 후관으로 갔다. 후관 문 앞에 1교시를 끝낸 학생들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이,
"어, 샘~, 눈이 왜 그래요?"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스크는 물론 끼고 있고 앞머리로 이마를 가린 채다. 눈이 겨우 보일 뿐이다. 잠깐 인사하는 찰나에 나의 눈 속을 보다니...하여튼 학생들은 예리하다.
"뭘?"
"눈이 빨개요."
"무슨 그런 말을? 짓궂긴."
그 학생이 장난을 거는 줄 알았다. 그러자 몇몇이 다가와 나를 자세히 보더니 울상을 지으며 걱정했다.
"혹시 어젯밤에 못 주무신 거예요?"
"샘, 아프지 마세요."
"샘,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알았어."
학생들에게 츤데레 인사를 해주고 수업할 교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장 교실 뒤쪽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어? 선생님, 왜 거울을 보세요?"
"선생님은 예뻐서 거울이 필요 없잖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거울 앞으로 가는 동안 학생들은 조잘조잘 별 말을 다 했다.
어라, 거울을 보니 눈 한쪽 부분이 빨갰다. 잠깐 전에 엘베 속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내 눈이 토끼눈이 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각막 실핏줄이 터진 듯했다.
"10반 애들이 내 눈이 빨갛다고 하길래 거울 보러 갔었지."
"어 진짜네요..."
"샘, 아프지 마세요."
"샘, 아프시니까 오늘 수업하지 말아요."
"샘, 눈이 빨개도 예뻐요."
(학생들이 예쁘다고 하는 것은 좋다는 말인 듯)
"눈이 빨간 색이니 핑크 공주예요."
"자자, 조용~, 이제 수업합시다. 쫙, 쫙, 쫙."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그 시간 수업을 끝냈다.
심한 감기가 나랑 한판 붙어보려 했었나 보다. 실핏줄을 터뜨리고 달아난 모양이었다.
보건실에 가서 점안액을 투여했다. 보건샘은 안과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 포기했다. 다음 날 빨갛던 눈이 꽤 좋아졌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입술이 부르텄다. 빨갛던 눈과 부르튼 입술을 보아 내게 침투했던 바이러스는 대단한 녀석이었던 것 같다. 나의 감기 증상은 미미했으나 눈과 입술에 흔적을 남겼다. 짓궂은 감기였다.
짓궂은 것은 학생들이 아니었다. 바로 감기였다.
애먼 학생들만 탓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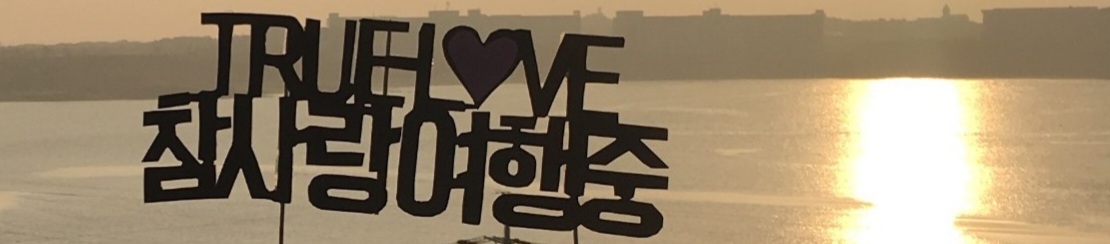
728x90
반응형
'영어교실 엿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멘티 딱지 떼기 (4) | 2024.04.28 |
|---|---|
| 텐션을 끌어 올리다 (2) | 2024.04.27 |
| 아무래도 방목형 담임인 듯 (2) | 2024.04.22 |
| 이런 학급 또 없습니다 (2) | 2024.04.19 |
| 그들의 교집합은 과학이었다 (2) | 2024.04.18 |



